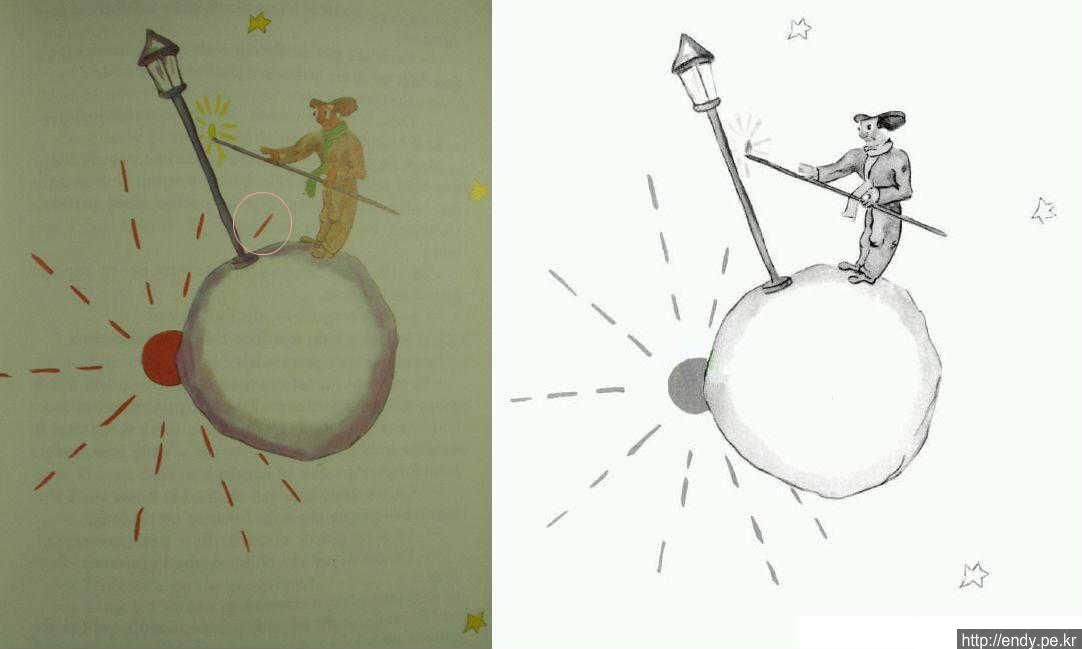“시에서 돈 냄새가 났으면 좋겠다”고 최영미 시인은 말했지만, 송경동의 시에서는 무슨 냄새가 날까. 광주천을 붉다고 쓴 시 때문에 얻어맞아 얼얼한 볼을 한 채로 맡은 봄 향기일까, 눅눅한 잡부 숙소의 때 절은 이부자리에서 나는 피 섞인 정액 냄새일까, 아니면 가끔 비정규직 일터인 지하로 내려오던 어느 아름다운 정규직 여 직원에게서 끼쳐오던 향수 냄새일까, 그도 아니면 아들과 놀이터 삼아 가던 사우나의 수증기 냄새일까. 『꿈꾸는 자 잡혀간다』는 운문의 제약에서 벗어나 비교적 자유롭게 쓰인 그의 줄글을 모은 책이다. 시집 속에서 그는 어쩔 수 없는 시인이었지만, 이 산문 속에서 그는 시인이기도 하고 시인이 아니기도 하다. 시인이 아닐 때 그는 노동자이자 투사이기도 하지만, 아버지이자 남편이자 아들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