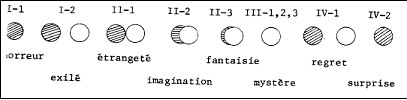시인이란 본래 패배자들이다. 글을 쓴다는 것은 그러므로 외부 세계에서 인정받지 못하거나 좌절된 자신의 욕망을 글을 통해서
배설하는 것일 따름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글 속에서 항상 욕망의 몸짓을 찾을 수 있다. 작가 이청준은 일종의 시원적 글쓰기로
일기와 편지를 상정하고 있다. 그는 「지배와 해방」이라는 단편에서 이정훈이라는 소설가의 입을 빌어 이렇게 말한다(이청준
2000, 111-112):
시인에게는 항상 어떤 '적敵'이 있다. 시인이 시를 쓰는 것은, 그러므로 항상 전쟁과 같이 치열한 것이다. 적어도 훌륭한 시인들은 그렇다. 그런데 그 적과 시인의 관계는 간단치가 않다. 어떤 의미에서는 적은 시의 원인이기도 하고, 시인의 동반자이기도 하다. 어떤 면에서는 가장 친숙한 존재가 바로 적일 수 있다. 시인은 그러므로 때로 그 적을 극복하려는 경향보다는 그 적 속에서 안주安住하는 경향을 보인다. 적이 없이는 시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가령, 김우창은 소월의 시를 논하면서 그 주主가 되는 전통적 정서 '한恨'을 두고 "고통은 세계에 대한 반격이 되지 않고 감미로운 슬픔이 되어버린다"고 비판한다. 그러나 그는 놀랍게도 곧이어 "素月이 의식적으로 전통적이 되었을 때, 보다 더 선명한 詩的 形象化에 성공한다"고 지적한다(김우창 1977, 45). 단순화시켜서 말하자면, 적은 시 자신인 것이다.
보들레르와 이성복의 적은 '권태'라고 할 수 있다. 권태ennui는 『쁘띠 로베르』 사전에 따르면 "① 깊은 슬픔, 커다란 슬픔 ② 어떤 모순을 겪는 고통 ③ 나태나 단조로운 일 혹은 관심의 상실에서 오는 피로와 텅 빔의 인상 ④ 막연한 우울, 관심을 잃게 만들고 아무 것에도 즐거움을 얻지 못하게 만드는 정신적 피로"이다. 권태는 슬픔이면서, 일종의 피로다. 그리고 그것은 텅 빈 것이기 때문에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막연한 것이다. 그 원인을 알 수 없다면 권태는 결국 치료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권태는 결국 삶의 파괴에 다름아니다(구연상 2003, 193):
그러므로 권태ennui라는 낱말은 우울spleen과, 그리고 나아가서는 죽음mort과 연결된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러한 부정적 상황은 시를 통해서 철저하게 형상화됨으로써 뚜렷한 예술적 성취로 나타난다. 보들레르와 이성복은 권태와 우울에서 그리고 죽음의 안에서 치열하게 시를 쓴다. 그리고 그 시가 목표하는 것은 권태와 우울과 죽음의 극복, 혹은 결국 권태와 우울과 죽음 그 자체이다. 우리는 보들레르와 이성복에게 있어서 권태가 어떻게 시적 대상으로 자리 잡는지의 과정을 볼 것이다.
잠정적 결론: 권태, 시의 동력
보들레르와 이성복에서 공통되는 것은 권태를 현실로 인식하고 그 현실에 대응하는 방안이다. 두 시인은 나란히 그 권태 속에서 잠을 자거나 죽음을 청했다. 물론, 그 대응 방향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이성복이 좀더 시대의 아픔에 직접적으로 민감했던 것은 80년대 한국의 상황과 떨어뜨릴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그 둘의 차이는 여전히 명백한 선을 긋고 있다. 이를테면 보들레르는 『악의 꽃』 마지막에 위치한 시 「죽음La Mort」에서
라고 말함으로써, 죽음이 가진 무언가를 시 중요하게 바라고 있다. 이미 헛된 이상이 보통의 '여행'에 대한 극복에서 사라져버렸으므로, 이 '죽음'은 어떤 이상향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 죽음은 죄péché와 연결된 권태가 교수대를 꿈꾸었듯이 어떤 보편적인 죽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죽음은 생이 그침이 아니라 새로운 삶인 것이다.
반면, 이성복에 있어서는 죽음조차도 그의 휴식은 아니다. 그는 애써 죽음에 도달해 무덤에 묻혔다가도,
에서 보는 것처럼 힘겹게 일어서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래서 그는 같은 시에서 "가능하면 이 잔을 치워 주소서……"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가능하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그는 죽기를 갈망하지만
는 비극적인 삶을 되풀이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그가 스스로를 위안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는 본질적으로 삶에 대한 애증의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는 비관주의의 인식으로 드러난다.
그러나 보다 본질적인 것은 두 시인의 공통점이다. 두 시인은 모두 삶을 '죄'와 '권태'의 현장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거기에서 두 시인의 시가 나온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보들레르가 「시계L'horloge」에서 그토록 두려워했던 것이 '시간'이었는데, 마지막 장에 가서 늙은 선장 죽음에게 "시간이 되었소!"라고 외친 것은, 시간이 곧 죽음이 그의 시의 동반자라는 것을 인식함으로써만 가능한 것이다. 한편, 이성복의 경우에도 시대의 아픔과 개인의 슬픔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만들어낸 말 '치욕'을 두고 "그토록 피해다녔던 치욕이 뻑뻑한, / 뻑뻑한 사랑이었음"(「오래 고통받는 사람은」)을 느끼는 것이다. 그리하여
라고 선언하는 시인의 마음속에서, 고통이 바로 자기 시의 동력이라고 느끼는 모습이 보이는 것이다.
참고문헌
이 일기 쓰기와 편지 쓰기의 행위에는 우리가 지금 찾아가고 있는 문제의 해답―다시 말해 작가가 왜 글을 쓰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중요한 해답의 단서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짐작을 하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마는 일기를 적거나 편지를 쓰거나 그런 것에 자주 매달리는 사람들은 대개가 바깥 세계에서 자기 욕망의 실현에 실패를 하는 경향이 많은 쪽이기 쉽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일기를 쓰는 행위가 보다 소극적이고 내향적인데 비해, 편지를 쓰는 사람 쪽이 조금은 더 적극적이고 외부 지향적이라는 차이는 있을망정, 어느쪽이나 똑같이 바깥 세계에 대한 공통의 원망을 지니게 됨으로써, 그 바깥 세계가 자기 생각과 주장에 거꾸로 승복해오기를 갈망할 뿐 아니라 궁극에 가서는 풍속이나 질서까지도 자기 식으로 뒤바꿔놓기를 바라는 내밀한 욕망을 지니게 된다는 점입니다.
시인에게는 항상 어떤 '적敵'이 있다. 시인이 시를 쓰는 것은, 그러므로 항상 전쟁과 같이 치열한 것이다. 적어도 훌륭한 시인들은 그렇다. 그런데 그 적과 시인의 관계는 간단치가 않다. 어떤 의미에서는 적은 시의 원인이기도 하고, 시인의 동반자이기도 하다. 어떤 면에서는 가장 친숙한 존재가 바로 적일 수 있다. 시인은 그러므로 때로 그 적을 극복하려는 경향보다는 그 적 속에서 안주安住하는 경향을 보인다. 적이 없이는 시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가령, 김우창은 소월의 시를 논하면서 그 주主가 되는 전통적 정서 '한恨'을 두고 "고통은 세계에 대한 반격이 되지 않고 감미로운 슬픔이 되어버린다"고 비판한다. 그러나 그는 놀랍게도 곧이어 "素月이 의식적으로 전통적이 되었을 때, 보다 더 선명한 詩的 形象化에 성공한다"고 지적한다(김우창 1977, 45). 단순화시켜서 말하자면, 적은 시 자신인 것이다.
보들레르와 이성복의 적은 '권태'라고 할 수 있다. 권태ennui는 『쁘띠 로베르』 사전에 따르면 "① 깊은 슬픔, 커다란 슬픔 ② 어떤 모순을 겪는 고통 ③ 나태나 단조로운 일 혹은 관심의 상실에서 오는 피로와 텅 빔의 인상 ④ 막연한 우울, 관심을 잃게 만들고 아무 것에도 즐거움을 얻지 못하게 만드는 정신적 피로"이다. 권태는 슬픔이면서, 일종의 피로다. 그리고 그것은 텅 빈 것이기 때문에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막연한 것이다. 그 원인을 알 수 없다면 권태는 결국 치료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권태는 결국 삶의 파괴에 다름아니다(구연상 2003, 193):
권태는 삶 자체를 무기력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권태는 사람을 게으름뱅이로 만들거나, 무능력자로 만들기도 하고, 그 결과 사람이 맺어야 할 갖은 관계들을 무너뜨리기도 한다. 더 나아가 권태에 빠진 사람은 삶의 필요 자체를 느끼지 못하거나, 삶을 위한 발전이나 도전 또는 모험 등을 부질없는 짓으로 간주하곤 한다. 권태가 나태를 낳고, 나태가 뒤떨어짐을 낳는다면, 권태는 승진탈락 내지 삶의 실패를 뜻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권태는 철저히 제거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권태ennui라는 낱말은 우울spleen과, 그리고 나아가서는 죽음mort과 연결된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러한 부정적 상황은 시를 통해서 철저하게 형상화됨으로써 뚜렷한 예술적 성취로 나타난다. 보들레르와 이성복은 권태와 우울에서 그리고 죽음의 안에서 치열하게 시를 쓴다. 그리고 그 시가 목표하는 것은 권태와 우울과 죽음의 극복, 혹은 결국 권태와 우울과 죽음 그 자체이다. 우리는 보들레르와 이성복에게 있어서 권태가 어떻게 시적 대상으로 자리 잡는지의 과정을 볼 것이다.
잠정적 결론: 권태, 시의 동력
보들레르와 이성복에서 공통되는 것은 권태를 현실로 인식하고 그 현실에 대응하는 방안이다. 두 시인은 나란히 그 권태 속에서 잠을 자거나 죽음을 청했다. 물론, 그 대응 방향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이성복이 좀더 시대의 아픔에 직접적으로 민감했던 것은 80년대 한국의 상황과 떨어뜨릴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그 둘의 차이는 여전히 명백한 선을 긋고 있다. 이를테면 보들레르는 『악의 꽃』 마지막에 위치한 시 「죽음La Mort」에서
오 죽음이여, 늙은 선장이여, 때가 되었소! 닿을 올리시오!
이 곳은 이제 지겹소, 오 죽음이여! 떠날 준비를 하십시다!
하늘과 땅이 잉크처럼 검다 해도,
우리 마음은, 그대도 알다시피 빛으로 가득차 있소!
그대의 독을 우리에게 부어 우리를 격려해 주오!
그 불꽃이 이토록이나 우리 머리를 불태우니, 원컨대
심연 깊숙히 잠기기를, 지옥이든 하늘이든, 무슨 상관이오?
미지의 깊숙한 곳까지, 새로움 찾기 위해.
O Mort, vieux capitaine, il est temps ! levons l'ancre!
Ce pays nous ennuie, ô Mort ! Appareillons!
Si le ciel et la mer sont noirs comme de l'encre,
Nos coeurs que tu connais sont remplis de rayons!
Verse-nous ton poison pour qu'il nous réconforte!
Nous voulons, tant ce feu nous brule le cerveau,
Plonger au fond du gouffre, Enfer ou Ciel, qu'importe?
Au fond de l'Inconnu pour trouver du nouveau!
라고 말함으로써, 죽음이 가진 무언가를 시 중요하게 바라고 있다. 이미 헛된 이상이 보통의 '여행'에 대한 극복에서 사라져버렸으므로, 이 '죽음'은 어떤 이상향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 죽음은 죄péché와 연결된 권태가 교수대를 꿈꾸었듯이 어떤 보편적인 죽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죽음은 생이 그침이 아니라 새로운 삶인 것이다.
반면, 이성복에 있어서는 죽음조차도 그의 휴식은 아니다. 그는 애써 죽음에 도달해 무덤에 묻혔다가도,
일어나라, 일어나
내 어머니 부르실 때마다
황폐한 무덤을 허물고 나는 일어섰다
- 「처형處刑」
에서 보는 것처럼 힘겹게 일어서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래서 그는 같은 시에서 "가능하면 이 잔을 치워 주소서……"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가능하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그는 죽기를 갈망하지만
희미한 불이 꺼지지는 않았다 아, 꺼졌으면 하고 중얼거렸다 꺼지지 않았다
- 「희미한 불이 꺼지지는 않았다」
는 비극적인 삶을 되풀이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그가 스스로를 위안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는 본질적으로 삶에 대한 애증의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삶이 가엽다면 우린 거기
묶일 수밖에 없다
- 「세월의 습곡이여, 기억의 단층이여」
는 비관주의의 인식으로 드러난다.
그러나 보다 본질적인 것은 두 시인의 공통점이다. 두 시인은 모두 삶을 '죄'와 '권태'의 현장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거기에서 두 시인의 시가 나온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보들레르가 「시계L'horloge」에서 그토록 두려워했던 것이 '시간'이었는데, 마지막 장에 가서 늙은 선장 죽음에게 "시간이 되었소!"라고 외친 것은, 시간이 곧 죽음이 그의 시의 동반자라는 것을 인식함으로써만 가능한 것이다. 한편, 이성복의 경우에도 시대의 아픔과 개인의 슬픔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만들어낸 말 '치욕'을 두고 "그토록 피해다녔던 치욕이 뻑뻑한, / 뻑뻑한 사랑이었음"(「오래 고통받는 사람은」)을 느끼는 것이다. 그리하여
오래 고통받는 이여
네 가슴의 얼마간을
나는 덥힐 수 있으리라
라고 선언하는 시인의 마음속에서, 고통이 바로 자기 시의 동력이라고 느끼는 모습이 보이는 것이다.
참고문헌
'타오르는책 > 詩'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경계의 시: 김록『광기의 다이아몬드』 (2) | 2005.09.22 |
|---|---|
| 입자의 크로놀로지: 이윤학『먼지의 집』 (0) | 2005.01.16 |
| 근대시와 그 고향: 보들레르와 이성복 (0) | 2005.01.03 |
| 현대시와 우리: 노혜경『뜯어먹기 좋은 빵』 (0) | 2004.10.01 |
| 나르시시슴과 그 확장: 김혜순 시 다섯 편의 분석 (0) | 2004.09.04 |